 도시 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는 "현재 지방 소멸이란 거대 담론이 제대로 세분화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실제론 아무도 이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본인 제공
도시 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는 "현재 지방 소멸이란 거대 담론이 제대로 세분화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실제론 아무도 이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본인 제공| ▶ 글 싣는 순서 |
①"강남역 가듯…맛집 갈까? 목포로 가요" 강진 사는 MZ들
②"왜 다 서울로? 울분이 찼다" '소멸 위기'로 사업하는 청년
③넥타이 '질끈' 서울내기가 400평 다래 농사 짓게 된 사연
④전 세계 50곳 돌았던 그녀…서울 아닌 '완주'였던 이유
⑤"남해의 미래요? 그냥 서울 가고 싶죠" 그럼에도 남은 이유
⑥"인구, 늘어봤자 정치인이나 좋아…지방 소멸 대위기? 과장됐다"
⑦지방 소멸 돌파구 '여기' 있다…골목길 경제학자의 처방전
|
"오후 2시
지하철 3호선 라인상의 강북 지역 어딘가에서 뵙는 것이 어떨까요?"
시민의 생활권은 '선'을 따라 만들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다웠다. 도시 문헌학자 김시덕 박사 주장에 따르면, 행정구역은 면 단위로 나뉘어 있지만 시민들은 교통망이라는 선을 따라 초광역적인 삶을 산다.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도민만 하루 약 200만명에 이른다.
반면 정치인들은 '면'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선거에서 표를 얻는 단위가 결국 행정구역별 주민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인구가 늘면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이나 행정가에게나 좋을 것"이라며 지방 소멸 위험성이 과장돼있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모두 붕괴 위기 직전마냥 묘사되곤 하지만, 그는 전북 완주군을 예로 든다. 이곳은 21년부터 인구가 꾸준히 증가 중이다. 외국인을 포함하면 작년 이미 10만 인구를 돌파했다.
김 박사는 "'지방 소멸'이란 거대 담론이 제대로 세분화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이야말로, 실제론 아무도 이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 증거"라고 일갈한다.
시민과 정치인의 세계관이 다르듯, 지방 소멸 문제 역시 '시민의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 박사. 지난달 광화문에서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시덕 박사는 "인구가 늘면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이나 행정가에게나 좋을 것"이라며 지방 소멸 위험성이 과장돼있다고 주장한다. 본인 제공Q. "인구가 늘면 정치인이나 행정가들한테나 좋을 것"이라는 지적이 인상 깊었다. 또 "지방 소멸 위험성이 과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김시덕 박사는 "인구가 늘면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이나 행정가에게나 좋을 것"이라며 지방 소멸 위험성이 과장돼있다고 주장한다. 본인 제공Q. "인구가 늘면 정치인이나 행정가들한테나 좋을 것"이라는 지적이 인상 깊었다. 또 "지방 소멸 위험성이 과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인구 감소가 반드시 문제는 아니다. 인구가 줄면 생활이 더 쾌적해지기도 한다. 인구가 줄어 가장 큰 문제를 겪는 이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줄어드는 정치인과 행정가들이다. 지역구와 공무원직 유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Q.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병폐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어디든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밀집된 환경을 추구한다.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란 책에 보면 나랑 똑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 인구 100만명 중에 한명쯤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LP바에 가서 와인 마시며 떡볶이 먹는 취미를 가진 사람 10명을 찾으려면 천만명이 모인 도시에서나 가능한 거다. 그게 서울, 뉴욕 같은 대도시의 매력이다. 또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Q. 집중화 현상이 지역 내에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 지방이 아닌, 지역 간에서도 불평등 구조는 존재한다. 부산 인구가 서울·경기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만 하는데, 사실 창원·울산 인구는 부산으로 흡수되고 있다. 부산 인프라가 좋아지니 빨려 들어가는거다. 앞서 말했듯, 밀집은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인구 감소와 거점 도시로의 집중화는 동시에 일어난다. 모든 지역을 다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특정 거점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걸 굳이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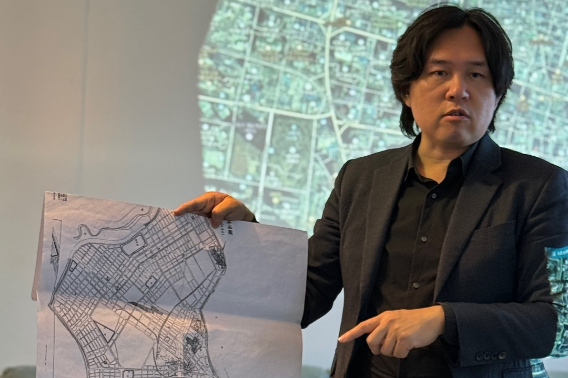 김 박사는 "부산 인구가 서울·경기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만 하는데, 사실 창원·울산 인구는 부산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밀집은 인간의 본능이고 인구 감소와 거점 도시로의 집중화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짚었다. 본인 제공Q.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왜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김 박사는 "부산 인구가 서울·경기로 빠져나간다는 얘기만 하는데, 사실 창원·울산 인구는 부산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밀집은 인간의 본능이고 인구 감소와 거점 도시로의 집중화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짚었다. 본인 제공Q.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왜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정치는 원래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인구와 국토인데 둘 중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지 않나. 그런데도 인구 감소는 이미 현실이다. 사실 한국에서 지방 소멸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온 계기도 2014년 일본 내각의 '마스다 리포트'다. 여기서도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다는 전제를 깐다. 유일한 대안은 이민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 정서상 이민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고, 이를 위해서는 거점 도시가 하나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도시와 국가 전반의 쇠퇴를 늦출 수 있다.
Q. 그럼 구체적으로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쏠리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 거점 도시들을 육성해 저지선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 대서울권, 중부권(세종), 동남권(부산)의 3대 메가시티와 6개 소권역에 인구가 몰리고 있다. 대전·세종·청주·계롱·논산 등을 아우르는 중부권 메가시티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국토의 중심부에 이러한 대도시 권역이 형성돼야 국가가 균형 발전을 이루고 인구 감소 속도도 늦출 수 있다고 믿는다.
사실 (저지선 구축을) 혁신도시가 해냈어야 됐다. 근데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도시를 여러 곳으로 쪼갰다.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광주, 대전, 대구 정도로만 이전지를 한정했어야 한다. 근데 한국은 그게 안된다. '왜 저 지역은 주면서 우리는 안주냐'고 나온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도시도 아마 쪼개는 식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Q. 정리하면 몇 개 도시 한정해서 밀집의 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건가?
맞다. 그게 콤팩트 시티다. 똑같은 인구라도 밀집돼 있으면 집적 효과가 발생해 병원이 한 두개만 있어도 다 커버할 수 있다. 교통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중심이 다 흩어져있으면 버스 배차 간격이 20분씩 걸리는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 대전이나 광주 가보면 계속 외곽에 택지를 만든다. 외곽 개발을 포기하고 집적시켜야 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고층 건물 올리면서 콤팩트 시티를 만들어야 한다.
Q. 인구가 밀집하면 경쟁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있다. 그런 것들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저출산율 세계 1위'라는 오명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싫으면 딴 도시 가서 살면 된다. 왜 서울에 와서 자꾸 전주나 춘천 수준을 원하는가. 지방 도시는 지방 도시의 길이 있는 것처럼 대도시는 대도시의 길이 있는 거다. 층고 제한, 개발 제한 등으로 서울의 성장을 막으려고 하면 안된다.
Q. 서울 외 지역들은 인프라 등이 붕괴돼 갈 곳이 없는 게 문제 아닌가?
그건 안 가봐서 그렇다. 안 가보고 서울, 경기도 외엔 사람 못 사는 데인 줄 알고 '살 곳이 없다'고들 한다. 비유하자면 집이랑 똑같다. '이 넓은 서울에 집 한 채가 없다'고 말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집은 결국 강남의 신축 아파트다. 주택 형태는 다양하고 선택지는 많다. 사람들은 경쟁이 싫다고 하면서 결국 남들과 똑같은 수준을 원한다. 개인주의가 안 돼서 그렇다.
강원도 춘천시나 전북 전주시는 꽤 살기 좋은 도시다. 충북 청주시 인근의 오창, 오송 이런 데는 일자리도 제법 많다. 지방 도시 여기저기 다녀보면 '이 정도면 살 만하다' 싶은 곳 많다. 다만 다들 바쁘고 어디가 괜찮은지 잘 몰라서 못 가볼 뿐이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가드렸다. (참고로 김 박사는 이런 답사 기록을 <한국도시의 미래>,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한국 문명의 최전선 > 등 여러권 의 책으로 펴냈다.)
'지방 소멸 대위기'라는 건 사실 정치인과 행정가들의 수사에 가깝다.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남하고 비교하기보다, 개인이 스스로 강해지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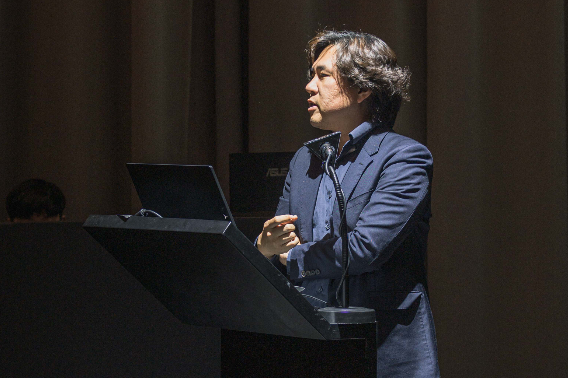 김 박사는 '지방 소멸 대위기'가 과장된 측면을 지적하면서 "개인 스스로 자각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인 제공
김 박사는 '지방 소멸 대위기'가 과장된 측면을 지적하면서 "개인 스스로 자각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인 제공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 박사는 답변을 마무리할 때마다 '이러이러한 대안이 있음에도 문제적 행정은 계속 될 것'이라며 비관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크고 작은 지자체가 여전히 자체 인구 늘리기에만 몰두하는, 공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곧 지방 소멸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각성을 강조했다.
"30년 뒤쯤에서야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망하겠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 일본이 그렇거든요. 작년부터 한국이 초고령사회(65세 인구 비율 20%)에 진입했잖아요? 일본이 17년 전에 이랬습니다. 한국은 20~30년 후 '우리 지역 따질 게 아니라 어디든 거점 도시 만들어서 한국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될 거에요. 그때도 많이 늦겠죠. 근데 원래 정책은 늦게 와요. 전세계 어느 나라든 정치에만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자각을 해야 됩니다."
※ [어쩌다, 지방?] 청년들의 풋풋한 모습을 숏폼으로도 보러오세요. 2360km를 달린 생생한 현장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인터랙티브 페이지로 접속하세요. 사이트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https://m.nocutnews.co.kr/Story/S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