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세린(전북 무형유산 제40호 가야금 산조 이수자)
◇ 김현정> 화제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전북 무형유산 40호가 가야금 산조입니다. 이 소중한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수자, 이수자, 보유자 그리고 인간 문화재를 지정하는데요. 여기에 드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지난 봄, 우리나라 최초의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 이수자가 탄생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출신의 조세린 교수. 돌아오는 가을에 가야금 기인 산조 음반 발표를 앞두고 계세요.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배제대학교 아펜젤러 국제학부의 조세린 교수,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조세린>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혼자 오시지 않고 15년 인연의 고수 한 분과 같이 오셨어요.
◆ 조세린> 예, 같이 왔습니다. 신승균 선생님 왔습니다.
◇ 김현정> 신승균 선생님, 반갑습니다.
◆ 신승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따가 이 두 분이 정말 멋진 연주를 들려주실 거예요. 기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카메라 보면서 뉴스쇼 청취자들께 인사 한 말씀하시겠어요? 조 선생님.
◆ 조세린> 알겠습니다. 2008년에 배제대학교 소속이 되고 지금 거기서 동양학을 가르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말마다 월화수목 가르치고 주말이 되면 가야금 병창, 가야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지금은 전주에서 전라북도 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40호로 이렇게 지금 이수자 됐습니다.

◇ 김현정> 조세린이라는 이름을 저는 새로 아예 그냥 한국 이름 만드신 건 줄 알았더니 영어 이름이.
◆ 조세린> 영어 이름이 조슬린.
◇ 김현정> 조슬린.
◆ 조세린> 조슬린이니까 그냥 조세린으로.
◇ 김현정> 조슬린 조슬린하다가 그냥 조세린 되신 거예요.
◆ 조세린> 예.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가야금을 처음 접하게 되셨어요?
◆ 조세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서양 음악 했는데 10대에는 일본에서 유학했어요. 근데 그다음 해 중국 갈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이런 악기 있다고 가서 그거 배우다가.
◇ 김현정> 일본에서는 일본 악기를 배우시고, 어떤 거 배우셨어요?
◆ 조세린> 일본의 가야금.
◇ 김현정> 일본의 가야금, 그 이름이 고토.
◆ 조세린> 고토라고, 예.
◇ 김현정> 그거 배우시고 중국으로 가서는 또.
◆ 조세린> 쟁.
◇ 김현정> 쟁을 배우시고.
◆ 조세린> 쟁을 배웠습니다. 그것도 가야금입니다.
◇ 김현정> 그걸 배우시고, 그러면은 우리 가야금은 가장 마지막에 배우신 거예요?
◆ 조세린> 마지막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일본 악기하고 중국 악기하고 많이 다르니까 그 조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모르고 근데 1년 동안 좀 많이 연구하고 듣고 듣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듣고 배우고 했더니 가야금의 그 매력에 좀 빠지고 나도 그런 재미 느끼고 싶었어요.
◇ 김현정> 그게 그러니까 1992년이 되는 건데, 가야금을 취미로야 할 수 있죠.
◆ 조세린> 취미보다 조금 더 진심으로 하려고 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을 건지 몰랐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될 줄은 모르셨어요?
◆ 조세린> 예.
◇ 김현정> 이수자가 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
◆ 조세린> 그렇죠. 다들 하는 사람 다 힘들어요. 한국 사람도 나도.
◇ 김현정> 이게 순서가 그러니까 전수자, 이수자, 보유자.
◆ 조세린> 그 중간에 준인간문화재 같은 거 조교가 있습니다.
◇ 김현정> 조교가 있고.
◆ 조세린> 보통 준인간문화재.
◇ 김현정> 준인간문화재라고도 부르고.
◆ 조세린> 그리고 보유자가 마지막 차례입니다. 난 못 올라가요. 이제 여기까지.
◇ 김현정> 신 선생님, 외국인이 사실은 우리나라.
◆ 조세린> 신 선생님도 이수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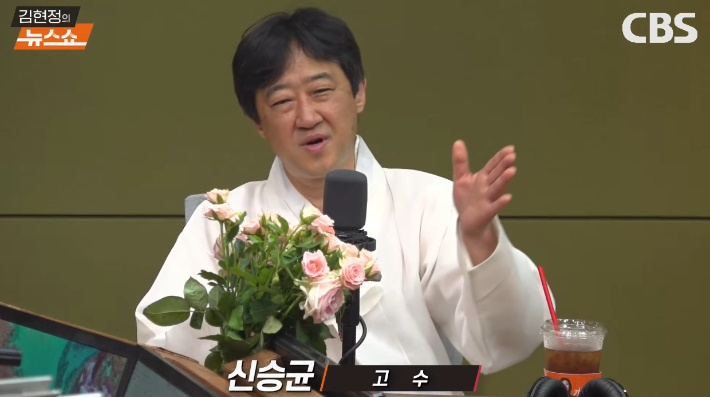
◆ 신승균>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입니다. 통영에 있는.
◇ 김현정> 남해안 별신굿. 제가 이수자 두 분을 모시고 하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 그렇군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이수자, 보유자, 전수자 하는 것이고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는데 이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이 가야금을 공부한다더라.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 신승균> 처음에 되게 감사했어요. 지금도 감사한 게 있는데 놀라운 것도 있지만 감사한 부분이 예를 들면 진짜 재밌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조가 장구 반주와 곁들여서 같이 연주하는 걸 몰라요.
◇ 김현정> 예.
◆ 신승균> 작가분들도 모르시는 분도 많고 다른 방송에 가도 마찬가지고. 판소리는 고법이 있는 걸 이제는 조금은 알아요.
◇ 김현정> 얼쑤. 이제 중간에.
◆ 신승균> 그러니까 그거 반주가 있어야 되고 같이 이렇게 되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한국 사람이 되게 많아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신승균> 근데 이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장단이라는 게 길고 짧은 거잖아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잖아요. 대보는 건 사람이랑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식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 실천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잘 모르잖아요. 장단이 뭔지.
◇ 김현정> 맞아요.
◆ 신승균> 길고 짧은 거를 왜 사람하고 대보는지, 왜 인본주의인지, 왜 홍익인간인지. 그런 것을 실천하시고 공부하시는 외국인 분이 계시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고.
◇ 김현정> 진심을 보셨군요.
◆ 신승균> 한국 사람도 알아채기 힘든, 너무 익숙해서 알아채기 힘든 한국의 미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세요.
◇ 김현정> 미학을 이해하고 계세요.
◆ 신승균> 그 아름다움. 한 번에 하나. 1타 2피는 없이, 1타 쌍피 없이, 1타 1피만 한 번에 하나씩 이게 우리나라 가야금이나 정서거든요. 한 번에 한 소리만 화음 없이. 목소리가 여러 개 화음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거를 하시고 계신 분이잖아요, 놀랍죠.
◇ 김현정> 가야금의 겉모습만 배우는 게 아니라 테크닉만 흉내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정신까지 알려고 하시더라. 놀라워요. 그게 뭐예요? 조 선생님. 우리 음악, 우리 가야금 안에 있는 흐르고 있는 정신은 뭐예요?
◆ 조세린> 가야금은 열리는 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씩 눌러야 되고 무게 있어야 되고 그것은 가야금의 매력인데 나도 지금까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럼 하나하나 하나 내는 악기니까 그 줄의 판소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승균> 줄의 판소리.
◇ 김현정> 줄의 판소리. 그러니까 줄로 독주를 하는데 산조가 독주거든요.
◆ 조세린> 줄로 노래하는 거예요. 목소리하고 똑같아요. 화음 없어서 하나 하나하나 그래서 한 음으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멋있어요.
◇ 김현정> 줄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흘리는 게 없이 그냥 꾹꾹 눌러가면서. 그럼 연습하다가 손이 성할 날이 없으셨겠어요.
◆ 조세린> 처음에는 피 많이 흘렸는데 지금은 굳은살이 생겼습니다.
◇ 김현정> 처음에 피 많이 보셨어요?
◆ 신승균>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 김현정>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 신승균> 선생님한테는 혼난 것밖에 없죠. 근데 그 혼나는 양만큼 우리의 실력으로 돌아오니까 혼나는 양만큼. 안 되는 거를 되게 해 주시는 분이 선생님이잖아요.
◇ 김현정> 근데 외국인이시니까 좀 봐주고 그러시는 건 없습니까?
◆ 조세린> 그거는 옛날이야기죠. 이제 안 봐줘요, 안 봐줘요.
◆ 신승균> 안 봐주세요.
◆ 조세린> 근데 내가 그거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냥 봐주시면 내가 남이죠. 그런 표시예요. 내가 그냥 외국인이니까 그냥 냅둬.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남이다. 안에 있는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똑같이 혼내주시니까 고맙다고 생각해, 나도 자기 새끼라고 생각하는 거고.
◇ 김현정> 이런 단어를 쓰시는 찐 한국인이시네요.
◆ 신승균> 찐이죠.
◇ 김현정> 이제는 정말 찐 한국인 조세린 교수님. 여기서 음악을 한번 직접 듣는 것 이상이 없잖아요.
◆ 조세린> 그렇죠.
◇ 김현정> 조세린 교수의 가야금 산조, 신승균 선생님의 반주 어떤 거 들러주시겠습니까?
◆ 조세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수자 된 것은 산조로 됐기 때문에 산조를 보여주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는 산소는 70분 넘어가요. 70분을 5분 안에.
◇ 김현정> 70분을 5분 안에, 여러분 한번 그 멋스러운 흥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그렇게 맑고 영롱한 소리가 나요? 선생님.
◆ 조세린> 연습.
◇ 김현정> 연습.
◆ 조세린> 연습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아름다운 가야금을 정작 우리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은 그렇게 가까이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 조세린> 그렇죠.
◇ 김현정> 그런 거를 보실 때는 마음이 어떠세요?
◆ 조세린> 이것은 어른들의 문제예요. 아이들의 문제 아니에요. 어른들이 자기가 제대로 안 배우고 안 좋아하니까 애들한테 그런 마음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애는 없어요. 다들 좋아해요.
◆ 신승균> 음악은 이야기니까요.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가고 세종문화회관을 가고 클래식을 보고 뮤지컬을 보고 제일 비싼 게 그쪽이잖아요. 그걸 왜 가서 보느냐? 그럼 현장감이잖아요. 그 사람의 에너지.
◇ 김현정> 교감.
◆ 신승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바를 느끼려고. 근데 원래 라이브는 원래 이게 우리나라 건데 저 명주실 나무로 된 자연으로 된 이런 걸 가지고 서로한테 직접 들려주는 게 우리나라 전통 예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아이들도 경험을 안 해봐서 그렇지 경험해 보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게.
◇ 김현정> 그러니까 조 선생님도 외국인이었는데 라이브를 보면서 그 에너지를 느끼고 교감하고 이러면서 폭 빠지신 거잖아요.
◆ 조세린> 그렇죠. 살풀이도 처음 볼 때는 무대에서 눈물이 났어요.
◇ 김현정> 살풀이 보시면서?
◆ 조세린> 살풀이 진짜 멋있었어요. 그런 춤이 나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진짜.
◇ 김현정> 9월에 가야금 산조 음반을 낼 계획으로 이제 녹음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 조세린> 예, 이거는 12년의 약속입니다. 조금 하면 조금 잘 나올 건데 지금 11년 동안 그렇게 미뤘어요.
◇ 김현정> 미루던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 조세린> 이제 이수자 돼서 녹음해도 된다고 연습하자고.
◇ 김현정> 가야금 산조 연주 음반, CD가 나오면 정말 울컥하시겠는데요.
◆ 조세린> 지금 CD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 김현정>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찐 한국인이십니다. 근데 선생님, 갑자기 저는 궁금해지는 게 가족분들은 미국에 계시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다. 제가 한국에 가서 가야금이란 걸 하겠습니다. 진짜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미국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 조세린> 아버지 말은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하려고 하면 끝까지 하라고. 가야금 하면 끝까지 하라고.
◇ 김현정>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33년 공부하면서 이제 무형유산 이수자까지 됐다는 거, 이걸 이제 영어로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 조세린> 이해 못 해요. 인간문화재 됐어요. 잘됐다.
◇ 김현정> 뭔지 모르지만 잘 됐다.
◆ 조세린> 자랑스럽다, 뭔지 모르겠지만.
◇ 김현정> 그렇게 동양에 대한 관심이 시작돼서 동양학을 전공하고 그게 가야금에 대한 관심으로 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신, 그래서 가야금산조 이수자까지 되신. 다음 꿈은 뭡니까? 조세린 교수의 이 다음은?
◆ 조세린> 다음은 계속 이렇게 내 꿈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어렵지만 너무 행복해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 김현정> 이런 분이 한국 최초의 무형유산 이수자가 되셨다는 게 저는 너무나 기쁘고요.
◆ 조세린> 진짜 선생님들 덕분에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진짜 이렇게 공부하는 게 그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 진짜 필요한 것은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아주 멋진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이 국악에.

◇ 김현정> 국악의 공동체, 조세린에게 가야금 산조란? 가야금이란?
◆ 조세린> 내 랩 스타일.
◇ 김현정> 나의 랩 스타일, 프리 랩 스타일. 멋있다. 신승균에게 조세린이란?
◆ 신승균> 평생 친구.
◇ 김현정> 평생 친구. 이 두 분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좀 멋진 연주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조세림린 선생님 한 말씀 인사해 주시겠어요.
◆ 조세린> 국악을 사랑해 주세요. 멋있으니까, 아름다운 국악을.
◇ 김현정>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승균 선생님 저쪽 카메라 보시면서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 신승균> 전통 예술이요, 재밌어요. 안 해봐서 그렇지 재밌습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김현정> 감사합니다. 두 분과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