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너 브러더스 코리아㈜ 제공
워너 브러더스 코리아㈜ 제공 고대 스파르타의 전사 파이다레토스는 당대 최고의 영예인 '300인 수비대' 선발 시험에서 낙방했다. 가문의 영광이자 일생의 목표를 놓쳤으니 좌절할 법도 했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환하게 웃었다.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그는 답했다. "우리 스파르타에 나보다 훌륭한 인물이 300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밝지 않습니까?"
낙방이라는 개인적 상실감보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유능한 인재를 보유했다는 대인배의 이 '위대한 미소'는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완주와 전주에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현재 완주와 전주 통합은 물 건너갔다는 열패감으로 스멀거리며 '낙후 전북'을 고착화 시키려 드는 모양새다. 이미 행정 경계를 허물고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함선을 건조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을 쳐다보면 어느 시인의 시구(詩句)가 절로 떠오른다. "너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
인구 소멸과 경제 침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는 상황에서, 이웃 지역들은 이처럼 각자의 성벽을 허물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반면 전북의 심장인 완주와 전주는 여전히 성벽도 아닌, 좁은 수로에 갇혀 있다. 통합 논의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반대 목소리는 마치 19세기 말 대원군이 세웠던 '척화비'를 연상케 한다.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고 독자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명분은 높았으나, 그 결과는 고립과 쇠퇴였음을 역사는 증명한다. 지금 완주- 전주를 둘러싼 '심리적 척화비' 역시 21세기판 쇄국 정치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오죽하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조차 완주-전주 통합을 촉구하며 전북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을까!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다. 통합이 이뤄지면 누군가는 군수직을, 누군가는 의원직을 잃게 되고, 또 입후보자들에겐 공천권 말소라는 치명상을 감내해야 한다. 위정자들에게 있어 평생 일궈온 정치적 영토를 내놓는 일은 가히 살점을 떼어내는 고통일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개인의 영달이 아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의(大義)의 영역 아니던가?
지도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통합의 물결을 막아선다면, 역사는 그를 '성장을 가로막은 쇄국 정객'으로 기록할 것이다. 반대로 살점을 떼어 내놓고서 통합의 마중물이 된다면, 그는 '위대한 결단가'로 기억될 것이다. 스파르타의 파이다레토스가 낙방의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작은 나'를 버리고 '큰 우리'를, 진정한 '정치의 영역'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완주군 제공
완주군 제공완주-전주 통합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고서 일방적으로 한쪽을 몰아주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님은 숱한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제 완주-전주 통합이 완주의 산업·농업적 강점과 전주의 도시 인프라가 결합하여 체급을 키우는 '완-전 시너지'이자 '완-전 윈윈' 전략으로 해석될 순 없을까?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식품은 '완-전 식품'이고 더 나아가 기업유치도 파격적으로 이끌어내는 '완-전 특구'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전과 광주가 거대 경제권으로 예산과 기업을 끌어올 때, 완주와 전주가 따로 존재한다면 전북은 어떻게 될까? '낙후 전북'에서 '더 낙후 전북'이라는 글자 한 자 추가는 걸로 끝날까? 완주를 둘러싼 정치권과 리더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지키려는 것이 '나의 자리'인가? 아니면 '지역의 미래'인가?
이제는 낡은 척화비를 허물고 '통합'이라는 배에 올라타야 할 때라고 본다. 아니 이미 늦었기에 하루라도 빨리 뱃전을 부여잡아야 한다. 살점을 떼어내는 아픔을 딛고 "나보다 훌륭한 미래가 있기에 낙방조차도 밝은 미소로 받아들인다"는 파이다레토스의 미소가 우리 정치권에서도 피어나길 바라는 건 역시 무리일까?
다시 한 번 완주를 둘러싼 정치권과 지역 리더들에게 외친다. "선택하시라! 훗날에도 전주를 둘러싼 완주군의 기형적인 모습의 지도를 새긴 척화비로 남을 것인지, 낙방한 파에다이토스의 미소로 남을 것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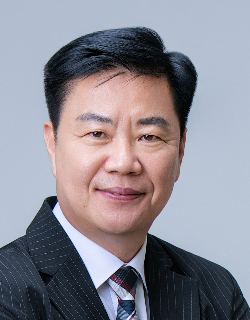 전북 CBS 이균형 대표
전북 CBS 이균형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