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xels 제공
pexels 제공습지생태학자 안창우 조지메이슨대 교수가 30여 년간의 연구와 삶을 기록한 생태 회고록 '나의 스웜프 씽'을 펴냈다. 질퍽거리는 습지의 리듬 속에서 인간의 삶을 비춰보는 이 책은 습지 보전과 생태문명 전환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과학·사유·문학을 아우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저자는 1996년 미국 유학 시절부터 조지메이슨대학교에서 습지생태학을 가르치며 생태공학·수문·토양 연구, 그리고 생태예술까지 경험한 자신의 여정을 풀어낸다. 그는 습지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젖고 마름을 반복하는 우리 삶 그 자체"라고 말한다. 책 곳곳에는 '콩팥습지' '미나리 실험' '사향쥐의 침입' '비버가 만든 마쉬' 등 연구 현장에서 길어 올린 생태적 통찰과 문학적 감수성이 녹아 있다.
특히 저자는 습지를 '경계의 생태계'로 정의한다. 물과 땅이 맞닿는 이 공간은 지구 면적의 6%에 불과하지만 전체 토양탄소의 25% 이상을 저장하는 핵심 탄소 저장고이자, 생지화학적 순환의 중심지다. 세계적 습지학자 윌리엄 미치의 분류에 따라 염습지·조석담수습지·맹그로브 스웜프·담수 마쉬·담수 스웜프·수변생태계·이탄습지 등 7가지 유형으로 설명하며, 보그·펜·무어로 불리는 이탄습지가 기후위기 시대에 갖는 생태적 의미도 깊게 다룬다.
책은 습지를 둘러싼 정책과 법적 모순도 비판적으로 짚는다.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Sackett v. EPA 판결로 '고립습지'가 청정수법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현실, 그리고 생태적 연결성을 무시한 법적 정의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모든 것은 그 외의 모든 것과 연결돼 있다"는 생태학자 배리 커머너의 말을 다시 꺼낸다.
연구자이자 교육자인 저자는 습지를 이해하는 학제 간 접근도 강조한다. NSF(미국국립과학재단) 지원으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생태공학·생태예술의 연계를 모색했고, 예술가 베찌 데이먼의 '생명의 물 정원', 바샤 얼랜드의 '얼음책' 등 생태예술 사례를 소개하며 자연을 바라보는 감각의 전환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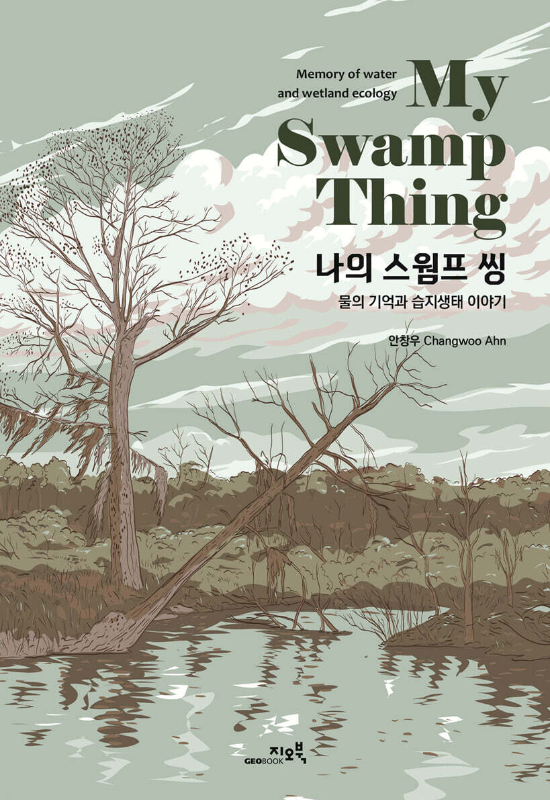 지오북 제공
지오북 제공
개인적 서사 또한 책의 중요한 축이다. 외국인 연구자로 미국에서 자리 잡기까지 겪은 고독, 올렌탄지습지의 반복된 현장 조사, 유학 초기의 언어적·문화적 괴리, 그리고 미꾸라지가 모기 유충을 먹는 모습을 처음 목격한 순간이 연구 인생의 방향을 바꿨던 기억 등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저자는 이를 "흐름의 기록"이라 부르며, 습지토양이 품은 '물의 기억'을 읽어내는 더트프로젝트(Dirt Project) 경험도 소개한다.
'스웜프 씽(Swamp Thing)'이라는 대중문화 속 괴물 캐릭터를 생태적 자아로 재해석한 점도 이 책의 독창성이다. 습지라는 모호한 경계에서 "괴물"처럼 떠돌며 정체성을 탐색했던 시간이 결국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는 고백이 이어진다.
기후변화, 생태위기, 자연 회복력, 생태정치, 교육 현장의 고민까지 포괄하는 이 책은 "습지를 안다는 것은 결국 삶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습지 연구를 통해 자연의 리듬을 읽어온 저자는 "물의 순환을 이해하는 것이 곧 기후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는 길"이라며 더 많은 이들이 습지 공부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한다.
안창우 지음 | 지오북 | 328쪽